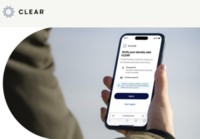삶이라는 고통스러운 축복'
-'새를 접다' 일부.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밤이 되면/ 나는/ 내 두개골을 벗어 벽에 건다/ 한낮의 소음과 소름에 시달린 두개골/ 벽에 걸린 그것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눈구멍은 어둡게 뻥 뚫려 있다/ 늙은 도마뱀처럼 자리에 누워/ 눈을 감는다/ 불 꺼진 방/ 시계탑처럼 허공에 매달려 빛을 내는/ 내 두개골' - '내 두개골 속에 고인 검은 불'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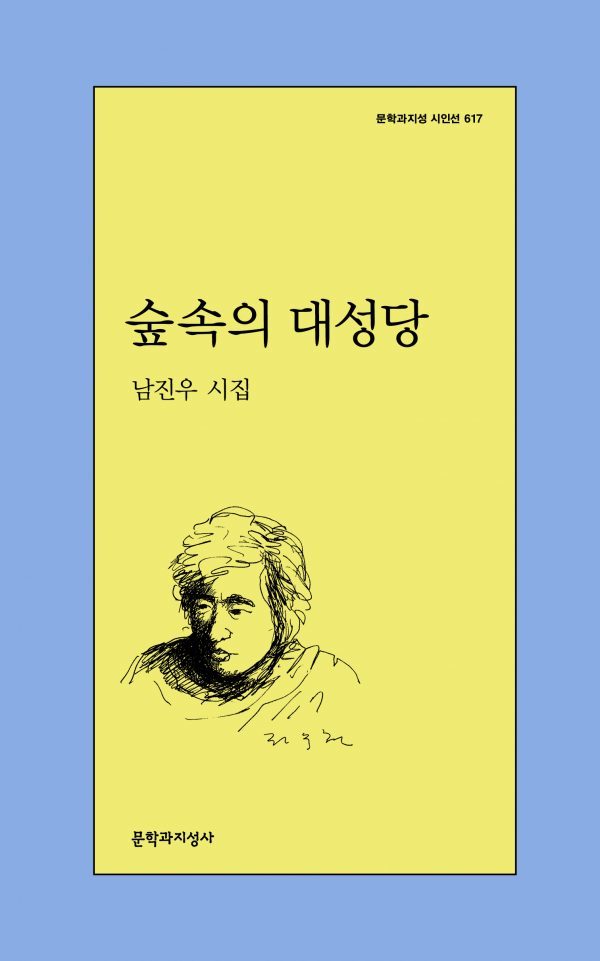
시는 이성과 감성의 산물이다. 그 시를 쓰는 시인은 누구보다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래서 시인의 눈과 귀는 늘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어쩌면 뛰어난 시인은 뛰어난 예지력의 소유자일 것이다. 일곱 번째 시집 '숲속의 대성당'(문학과지성)을 펴낸 남진우는 죽음에 관한 예지력이 느껴지는 시인이다.
'죽음을 깨뜨린 자만이 마주할 수 있는/ 삶이라는 고통스러운 축복'('새를 접다' 일부)이라고 노래하는 그는 언젠가 시 쓰기란 "죽음을 향한 매혹과 그것의 유예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다"고 고백한다. 어느덧 중견의 자리에 와 있는 그는 비교적 담담하게 죽음을 이야기한다. 미증유의 시대에서 시인의 소임이란 "우주 저편의 소식을 받아 적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산문학상 시 부문 수상 소감 중)고 말했던 그는 지금 우주 저편에서 오는 죽음의 시그널을 받아 적고 있다.
'달려라 생쥐야 둥근 숫자판을 달려/ 꼬리에 붙은 불꽃이 네 온몸을 불덩어리로 만들기 전에/ 갉아먹어라 생쥐야 유리와 철과 크롬으로 도금된 세상을/ 아직 너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째깍 /이미 너는 죽은 다음이란다 째깍// 얼어붙은 시간을 일 초 일 초 힘겹게 밀어내면서/ 불타는 햇빛 속에서 시계가 녹아내리고 있다' - '불타는 시계는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지 못한다' 일부.
늘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만 시인에게 삶이란 공중과 바닥, 이승과 저승을 가로지르며 마침내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생명력이다. 그래서 죽음은 관념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다. 시집의 뒷표지에 쓴 시인의 짤막한 글이 이 시집을 읽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길지만 그냥 다 인용해 본다.
'부처로 일컬어지는 고타마 싯다르타는 공양받은 음식을 먹고 거기 든 상한 돼지고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며 죽어갔다. 등창이 심해져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운 채 죽었다. 무상정등정각의 경지에 이른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에게 그늘을 드리운 사라수가 가지를 기울여 꽃 공양을 했다는 아름다운 설화는 말 그대로 설화일 뿐이다.
기적의 신비로 둘러싸인 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 죽음의 장면은 유독 사실적이고 압도적으로 인간적이다. 나는 출가 후 그가 실천한 금욕주의와 그가 설한 연기와 무아의 진리에 관한 위대한 말씀들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죽음에 임해 투철하게 육체적 괴로움을 겪어낸 그 장면의 진실성을 사랑한다.'
시집을 다 읽고 나면 그가 맞서 싸우는, 혹은 맞서서 관조하는 죽음에 대해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만 시인의 죽음은 좀 더 예민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하는 시집이다. 값 12,000원.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