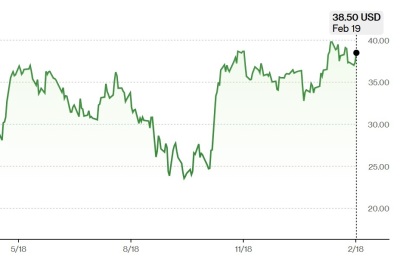[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 중견 시인 박상봉이 새 시집 '불 꺼진 너의 단어 곁에서'(몰개)를 출간해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시집 출간으로 분주한 박상봉 시인을 잠시 만나봤다.

-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집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집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 이번 시집의 핵심 주제는 '언어와 묵음의 경계', 다시 말해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과 문장으로 세계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은 말보다 앞서 있고, 말 이후에도 남아 있는 침묵과 여백 속에서 더 깊이 살아집니다.
시집 '불 꺼진 너의 단어 곁에서'는 바로 그 지점, 불이 꺼진 단어 곁에 남아 있는 숨, 체온, 망설임, 미처 발화되지 못한 감정들을 시로 불러내고자 한 작업입니다. 이 시집을 통해 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는 어떻게든 통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언어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시가 열리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2007년 첫 시집 이후 2021년과 2023년 그리고 2025년 말에 네 번째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고교 시절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던 소년문사로서 활약에 비해 기성시인이 된 후 첫 시집이 늦은 반면, 최근에는 시집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첫 시집이 늦어진 것은 시를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를 책으로 묶을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시는 제 삶의 밑바닥에서 천천히 발효되고 있었고, 직장 생활과 생계, 지역 문화 활동 속에서 시는 늘 뒤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며 삶이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접어들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말해두지 않으면 사라질 것들, 기록하지 않으면 묻혀버릴 감각들이 분명해졌고, 그때부터 시가 한꺼번에 밖으로 나오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의 연속 출간은 속도가 아니라 축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문학창작촌은 어디어디 있는지요? 창작촌 거주 경험이 시 쓰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우선 전남 해남에 위치한 토문재와 백련재 문학의 집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동안 외부 일정과 일상적인 소음을 최소하는 환경에서 시집 원고 집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작품의 전체 구조를 재정비하고 시편 간의 정서적 흐름과 주제의 연관성을 점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학창작촌과 레지던시 공간에 머물며 글을 썼습니다.
시집은 공공지원사업을 통해 확보된 창작 환경과 시간, 간접지원(멘토링·공간 지원 등)이 작품 완성도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특히 집필 이후 이어진 집중적인 퇴고 과정에서 지원사업이 제공한 창작 환경은 작품의 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지원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작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들이 일상의 역할과 이름에서 잠시 벗어나 '시인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창작촌의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언어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밀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집에서는 그 경험이 문장을 줄이고, 소리를 낮추고, 여백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시집의 51편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시 한 편을 꼽는다면 어떤 작품입니까?
▲ 한 편만 고르라면 마지막 작품인 '붓꽃'을 꼽고 싶습니다. 이 시는 이번 시집 전체의 정서와 태도를 가장 응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무엇이 남는지, 단어가 더 이상 빛나지 않을 때에도 관계와 삶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인용된다면 독자들이 시집의 결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 새해를 맞아 작품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입니까?
▲ 당분간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청음의 시학', '침묵의 미학'을 조금 더 밀도 있게 확장하는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역의 시인들과 독자를 잇는 낭송회, 책방, 문학 행사 등 시가 다시 몸과 목소리를 얻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시는 혼자 쓰이지만, 결국 공동의 숨결 속에서 살아남는 언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하석 시인은 이 시집의 발문에서 박상봉 시인의 시를 "소리의 경계에 귀를 대는 간절함"으로 표현했고, 엄원태 시인은 "게송 같은 시인의 진술은 그 음역이 낮지만 그윽하고 힘이 세다"고 평가했다.
붓꽃은 대지가 쥔 붓 // 바람이 지나가면 획이 그어지고 / 햇빛이 스며들면 잉크가 번진다 // 강가에 늘어선 붓꽃 군락은 / 거대한 원고지의 푸른 줄 / 보랏빛 꽃잎은 쉼표나 마침표다 // 떨어진 꽃잎은 여백이 되고 / 씨앗은 또 다른 문장의 서두가 된다 // 시인은 붓꽃 앞에서 읽는 자일 뿐 / 파도는 행서, 나뭇잎은 초서, / 붓꽃은 정갈한 해서체다 // 적벽을 묵묵히 필사한다 / 너른 대지에 먼저 써둔 문장을 / 겨우 흉내 낼 뿐이라도 // 한 자루 필생의 붓으로 베껴 쓴 시 / 압화(押花)처럼 어느 책갈피에서/되살아날 것을 믿는다 // 그것을 간절이라 부르련다 // 간절곶 아래 붓꽃 한 송이 파랗다 // 파도 닮아 파랗다('붓꽃' 전문)
박상봉 시인은 경북 청도 출생으로 1981년 '시문학' 추천과 박기영, 안도현, 장정일 등과 '국시' 동인으로 등단하여, 1985년 대구에서 북카페·문화공간 '시인다방'을 경영했다. 문화기획자 겸 시인이다. 시집으로 '카페 물땡땡' '불탄 나무의 속삭임' '물속에 두고 온 귀' 등이 있으며 대구시인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yrk5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