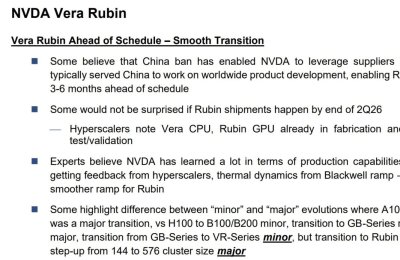의료·세금 기록도 단속에 활용…미 시민도 '빅브라더' 공포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첨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한 불법 이민 단속을 넘어 미국 시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감시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연방 기록을 인용해 ICE가 감시 기술 확보를 위한 지출을 늘려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AI, 차량 번호판 인식기 등 첨단 장비 확보에 3억 달러(42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감시 강화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 추방 프로그램'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월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300억 개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의 안면 인식 도구를 380만 달러(53억 원)에 구매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감시를 확대해 이민 집행 작전의 단서를 찾기 위해 수십억 개의 온라인 게시물을 샅샅이 뒤질 계획이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스키프 트레이싱(skip-tracing)' 서비스다. 채권 추심업계가 도망친 채무자를 찾는 데 쓰는 이 기술 도입을 위해 ICE는 10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까지 최대 10억 달러(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실상 민간의 추적 기술을 공권력 집행에 전면 도입한 셈이다.
이 같은 감시 역량 강화는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규제를 대폭 완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맞물려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1974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은 사회보장국(SSA)이나 국세청(IRS)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이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그러나 ICE는 규제 완화를 틈타 여러 연방 부처와 대규모 데이터 공유 협정을 체결, 매달 수만 건의 정보를 넘겨받고 있다. IRS의 경우 협정 체결 후 4개월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기록을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ICE의 감시 대상이 이민자를 넘어 일반 시민과 정치적 반대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최근 요원에 대한 '폭력적 위협'의 범주에 '단속 현장 촬영'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의 매튜 구아릴리아 연구원은 "ICE는 이제 단순히 이민자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 시위자나 비판자를 감시하는 '정치경찰'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우세 지역 주정부들은 ICE의 자동차국(DMV)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 역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데이터 공유를 일시 중단시키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백악관은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정면 대응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