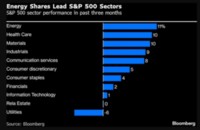2025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국제질서의 격랑과 국내 정치의 진폭 속에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의 재점화, 미중 신냉전과 세계무역 질서의 붕괴 조짐 속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글로벌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다.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지속된 정치적 긴장과 시민사회의 분열은 민주주의의 내구성과 법치의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이처럼 치열한 대립과 혼돈의 정국을 지나 제도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균열과 정치적 피로감이 남아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정국 속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정치세력은 단연 보수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청년층의 이탈, 철학적 공백, 리더십 부재라는 삼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영남지역 기반 의원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지탱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의 존립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 과연 국민의 힘은 국민의 기대를 다시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재구성하고, 기술과 안보의 글로벌 지형 속에서 실용적 전략을 설계하며, 공동체의 윤리를 회복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지금 보수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성찰로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해방과 분단, 전쟁과 재건,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국가적 시련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승만의 자유당은 부정선거로 자멸했지만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고, 박정희의 공화당은 정통성의 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기초복지제도를 도입했다. 이어진 민정당과 한나라당은 경제안정과 교육 및 의료체계의 확립 등 국가적 기반 형성에 기여했으며,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통해 외교안보 전략을 견인하였다. 보수정당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중심축 중 하나였다. 그러한 정통 보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정당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체성을 복원하는 필연적 과제이며,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국민적 자산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그 성찰을 위해, 세계 주요 보수정당들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철학과 가치 위에서 성장과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 보수당의 실용적 전통, 독일 기민당의 사회적 시장경제, 미국 공화당의 자유주의적 연방주의, 그리고 이들 정당이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 구체적 사례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캐나다와 스웨덴 보수당의 좌절과 재건을 살펴 보면서 한국 보수정당의 재구성과 철학적 재건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제 보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의 유산으로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철학과 실천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한 사색의 숲으로 들어가 보자.

보수는 위기의 산물이었다, 세계 보수정당들의 창당의 순간들
영국 보수당의 기원은 1834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발표한 "탬워스 선언(Tamworth Manifesto)"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 보수주의의 기초를 놓은 로버트 필(Robert Peel)은 곡물법(Corn Laws)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현대 보수정당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전환점을 만들었다. 곡물법은 영국 내 곡물 수입을 억제하여 지주 계층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토지 귀족의 이익에는 부합했지만 도시 노동자와 아일랜드 농민에게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1845년 아일랜드 대기근(Great Famine)이 발생하자 필은 기존 보수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그당(Whigs)의 지지를 얻어 곡물법 폐지를 단행하였다. 이는 보수당 내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당의 분열을 초래했으나, 필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 정당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 남았다.
이로써 필은 '실용적 보수주의'(pragmatic conservatism)의 전통을 확립하고,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치 철학자 홉하우스(Thomas E. H. Hobhouse)는『필과 보수당의 정신 (Peel and the Conservative Mind)』에서, 필의 결정이 "귀족적 보수에서 책임 중심의 대중보수로 전환하는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한다. 또한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의 『필부터 대처까지의 보수당 (The Conservative Party from Peel to Thatcher)』에서 이 시기를 "보수주의가 자기 희생과 사회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 결정적 장면"으로 묘사한다. 필의 이러한 결단은 이후 보수주의가 단지 특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부응하며 공동체 전체를 위한 책임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억된다
필이 발표한 탬워스 선언(1834)은 토리당에서 진화된 새로운 정당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필은 이 선언에서 전통적인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되, 시대 변화에 맞는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혁명 이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귀족과 왕권 중심의 정치에서 시민계급의 권리 확대, 종교 관용, 시장경제의 확대를 수용하면서도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보수주의를 "합리적 개혁(rational reform)의 주체"로 정의했고, 이는 이후 보수당의 핵심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영국 보수당의 창당 정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상가는 러셀 커크(Russell Kirk)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정신(The Conservative Mind)』(1953)에서 보수주의를 일시적인 정치 전략이 아닌, 인간의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깊은 통찰로 설명한다. 커크는 보수주의의 여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핵심은 "초월적 질서의 인식,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현실주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인정, 전통에 대한 존중"이다. 그는 보수주의의 본질을 "관념이 아닌 살아 있는 경험과 역사적 기억"에 두었다.
또한 T. S. 엘리엇(T. S. Eliot)은 『기독교와 문화(Christianity and Culture)』에서 보수주의의 문화적 기반을 강조한다. 엘리엇은 전통의 본질을 "무비판적인 반복"이 아니라 "비판적 선택과 현재에 대한 재해석"으로 보았다. 그는 공동체의 연속성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보수주의의 중심 과제로 간주했으며, 현대 문명이 개인주의와 파편화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적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철학은 20세기 독일의 기독민주당(CDU) 창당에도 강하게 반영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은 나치의 유산, 전쟁의 폐허, 도덕적 파탄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 정당체제를 연구한 살펠트(Thomas Saalfeld)는 그의 연구서『독일정당체제: 지속성과 변화 (Germany's Party System: Continuity and Change), 2002』에서 1945년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와 루트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등이 주도한 CDU는 기독교 인본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초로 삼아 서독 재건의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시장과 공동체적 책임, 질서와 자유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보수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했다. 아데나워는 『기독교적 사회 질서(Christliche Gesellschaftsordnung)』에서 경제적 자유는 도덕적 책임과 결합될 때에만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였다. 리차드슨 (Heather Cox Richardson)의 저서 『인간의 자유를 위하여: 공화당의 역사 (To Make Men Free: A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 2014』에 서술되어 있듯, 1854년 창당된 공화당은 당시 노예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도덕적·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 보수의 실험이었다. 링컨은 노예제 반대와 연방의 통합을 보수의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분열을 극복하고 헌법적 질서를 지켜내는 정치의 힘을 보여주었다. 링컨은 보수를 "가장 오래된 이상을 가장 새롭게 실현하는 정신"으로 정의했고, 이는 이후 공화당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이처럼 보수정당의 창당은 가난과 기아, 전쟁의 폐허와 기아와 좌절이라는 시대적 격변기 속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지키고 재구성하려는 철학적·정치적 결단이었다는 공통점을 간직하고 있다. 단순히 과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미래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보수의 성장, 위기를 넘어선 국가 건설의 동력
보수정당이 단지 체제 유지의 도구로 기능했다면, 그 생명력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보수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체제를 재설계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로 거듭나며 진화해왔다. 각국의 보수정당들이 국가 재건과 제도 개혁, 복지국가의 기초 설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자.
영국 보수당의 재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벤저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다. 그는 보수당을 단순한 귀족 정당에서 제국의 전략과 대중의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1875년, 이집트가 경제 위기로 스에즈 운하의 지분 매각을 고려하자, 디즈레일리는 로스차일드 금융그룹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마련해 영국 정부 명의로 스에즈 운하 주식을 매입했다. 이 전략적 결단은 영국이 인도 통치를 위한 해상통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 보수당이 안보와 외교를 주도하는 중심 정당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또 도시 위생, 주거 개선, 교육 개혁 등 복지 입법도 병행하며 '두 개의 국민'(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해소하려 노력했다.
영국 보수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에 내 주었던 정권을 다시 찾아 오면서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창설과 교육 개혁 등 일부 핵심 정책을 수용하며 실용적 보수주의를 전개해 나갔다. 특히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 지도자를 넘어 국가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이후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의 시대는 보수정당이 자유시장주의로 대전환을 이룬 시기였다. 『철의 여인(The Iron Lady)』로 불리는 대처는 『자유의 길(The Path to Power)』에서 작은 정부, 노동조합 개혁, 금융 자유화 등을 통해 영국 경제를 탈산업화 이후의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했다.
독일 기민당의 성장 역시 주목할 만하다.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는 『번영을 위한 전략(Wohlstand für Alle)』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정립했다. 그는 자유시장과 경쟁을 인정하되,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델은 독일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고, 서독의 경제 기적(Wirtschaftswunder)을 가능케 했다. 동시에 NATO와 유럽공동체(EEC) 통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집권한 헬무트 콜(Helmut Kohl)은 통일 독일의 설계자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우려를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고, 1990년 독일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시키는데 성공했다. 콜은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은 공통된 과정"이라 선언하며, 보수주의가 단순한 중산층과 기업중심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익극대화를 중심에 둔 실용정치임을 입증했다. 결국 콜의 외교전략은 동독의 해체를 이끌었고, 철옹성 같았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의 통일로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공화당은 레이건 시대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보수의 정체성을 재정립했다. 『레이건 연설집(Reagan: A Life in Letters)』과 『보수주의의 승리(The Triumph of Conservatism)』에서 볼 수 있듯, 레이건은 반공, 감세, 작은 정부, 자유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서 꺼내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시켰다. "미스터 고르바초프, 이 벽을 허무시오(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라는 그의 명언은 보수가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공급중심경제(Supply-side economics)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보수를 "자유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았고, 이는 21세기 이후 세계 보수정당의 모델로 작용했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는 보수주의가 단순한 전통 수호나 반동적 정치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서 안보, 외교, 경제, 통일, 세계적 위상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준다. 보수는 과거의 유산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보수주의는 국가를 위한 진정한 실용의 철학이자, 도덕적 책임의 정치였던 것이다.
②편에 계속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