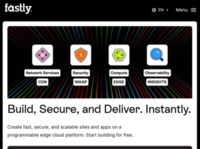그해 크리스마스 때였다. 일주일간의 휴가가 주어져 모두들 여행 계획을 짜느라 분주했다. 끼리끼리 어울려 인근의 섬이나 도시로 떠났다. 나도 절친하게 지내던 마카오 남자, 강으로 다이빙 하던 이디오피아 청년, 말레이시아 여자와 한 팀을 이루어 세부 섬으로 떠났다. 빼어나게 아름답기로 유명한 세부는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1986년 말 그때엔 사람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천연의 섬이었다.
태평양 위를 지나는 우리 배는 그날 밤 내내 극심한 태풍에 시달렸다. 큰 배인데도 파도를 못 이겨 밤새도록 좌우로 요동치듯 흔들렸다. 갑판 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사람들이 밀려갔다 밀려오곤 했다. 우리도 그 틈에 끼어 갑판의 밧줄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고 있었다.
콜라병, 먹다버린 캔 구르는 소리, 아우성과 구토, 울음과 비명, 칠흑 같은 어둠, 검고 사나운 파도, 철렁철렁 내려앉는 가슴, 공포....다음 날 새벽에 도착한 세부 섬 부둣가의 신선함이란! 정갈한 바다 내음, 상쾌한 바람, 정박해 있는 어선들, 끼륵끼륵 날고 있는 갈매기....그곳에서의 몇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수도원을 누군가의 안내로 방문했고 그곳에서 고상한 신부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수도원의 창을 통해 세부 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걸어올 때와는 다른 차원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리고 한적한 수도원을 걸어나와 세부 섬을 구체적으로 돌아다니려 했을 때 어디선가 작달만한 원주민 한명이 다가와 이곳보다 더 아름다운 섬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 외에는.
그 원주민이 말을 잘 했던지 아니면 우리들이 똑같이 그의 말에 솔깃하게 빠져들었는지 그 과정 역시 흐릿하지만 원주민이 신이 나서 어디론가 달려나가듯 걸어간 걸음걸이만큼은 또한 생생하다. 우리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 그가 끌고 온 배는 모터를 달아놓은 나룻배였다. 판때기를 듬성듬성 짜놓아 바닥 밑이 보일듯말듯한. 불안해 보이는 그 조그만 배에 우리 넷과 원주민이 올라탔다.
시퍼런 바다 위를 그는 무서운 속도로 몰아댔다. 칼날 같은 파도가 들이닥칠 때마다 배가 붕 떴다가 방향이 꺾여 물에 떨어지곤 했다. 그때마다 배는 뒤집힐듯 흔들렸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속도를 줄이자고 내가 소리 질렀더니, 속도를 줄이면 배가 물 속으로 빠질지 모른다고 오히려 큰소리쳐왔다. 아니나다를까 바닥 밑에서 물이 새어들고 있었다.
가라앉는 속도보다 더 빨리 무지막지하게 한 시간쯤 달려간 곳. 섬이 있었다. 온통 하얗다. 화이트 아일랜드라는 별명이 붙은 섬. 에게 해에 뜬 미코노스라는 아름다운 섬은 하얀 칠로 섬 전체를 도배해 하얗지만, 이 섬은 천연 그대로 하얗다. 하얀 모래들이 응결되어 만들어진 섬이란다. 바닷물에 휩쓸려가기 마련인 모래들이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응결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신비의 섬.
그곳엔 우리 다섯밖에 없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없었다. 구름도 없었다. 하얀 땅과 파란 하늘뿐. 우린 맨발로 걸었다. 그러나 순간 발을 떼야 했다. 하얀 모래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원색의 시뻘건 태양이 중천에 떠 있었다. 황홀한 광경이었다. 바다에 떠있는 새하얀 불사막. 그리고 내 곁에 걷고 있는 검은 친구, 중국인 청년, 무슬림 처녀, 까무잡잡한 원주민. 우리는 발을 불로 지지며 내달렸다.
바다. 백 미터 깊이까지는 족히 보일 것 같았다. 물 속 바닥 역시 하얀 모랫빛이었다. 무수한 물고기들이 그 푸르스름한 투명 속을 헤집고 다녔다. 서로 물을 끼얹고 달리고 넘어지고 쾌감의 비명을 지르며, 물보라치는 바다 속으로 태양을 안고 뛰어드는 우리들. 부서질듯한 배를 타고 몸서리치는 파도 위를 또다시 끔찍한 공포 속에 달려 돌아가야 하지만, 그런 생각은 나지도 않았다.
민다나오에 오기 전 서울에서 몇 번 만난 적 있는 현주로부터 엽서가 날라온 것도 그 즈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