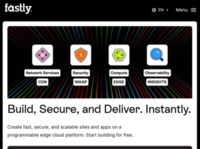ETF·주식이 첫 자산 형성 수단으로 부상
'전·월세+투자'가 더 유리하다는 인식 확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에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들이 내집 마련 대신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사실상 첫 자산 형성 수단으로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P모간체이스 인스티튜트 자료를 소개하면서, 집값 급등과 고금리로 주택은 멀어지는 반면 증시 강세와 모바일 브로커리지 확산이 젊은 세대의 여윳돈을 시장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JP모간체이스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25~39세 가운데 연간 투자계좌로 돈을 이체한 비중은 2013년의 3배를 넘는 14.4%까지 뛰었다. 25세 전후 연령대의 경우 2015년 6% 수준에서 최근 37%까지 치솟아 같은 기간 40세 이상보다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주택 구매 문턱이 높아진 사이 금융자산 비중이 커지면서 "젊은 세대의 부 축적 경로가 집에서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집값과 금리에 치여 '내 집 마련' 대신 투자로 선회한 개인 사례도 잇따른다.
시카고에서 콘도 자금을 모으다 포기하고 1만 달러(약 1,445만 원)를 인덱스펀드로 돌린 30대 직장인은 6년 만에 약 66% 수익률을 거두면서 "평생 집을 안 사도 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뉴욕 맨해튼에 사는 20대 투자자는 화재·기후위기 리스크 등을 이유로 "집보다 주식이 더 안전하다"며, 화석연료를 뺀 펀드에 6년간 모은 3만 달러(약 4,333만 원)가 장기 복리 기준 노후 자산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 '전·월세+투자'가 더 유리?
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전·월세+투자' 대 '자가 보유'의 장기 수익 비교도 젊은 세대의 인식을 움직이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30년 동안 '주택 보유'와 '임대 후 투자'의 수지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전제가 붙긴 하지만 투자자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디스는 연 소득 15만 달러(약 2억 1,665만 원)인 두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30년 후 누가 더 부유해지는지 계산했다. 주택 구매자는 50만 달러(약 7억 2,215만 원)짜리 집을 20% 다운페이와 6.25% 금리로 구입한 것으로 가정했다. 보험, 재산세, 유지비 등을 포함한 월 지출은 3,546달러(약 512만 원)였다.
반면 투자자는 비슷한 주택을 월 2,500달러(약 361만 원)에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가 3%씩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그는 주택 보유 비용과 임대 비용의 차액을 매달 투자하며 연 10% 수익률을 기대했다.
30년 후, 임차 투자자의 순자산은 281만 5,825달러(약 41억 원)로 집주인의 순자산(약 162만 1,699달러, 약 23억 원,주택 가치 연 4% 상승 가정)보다 119만 4,126달러(약 18억 원) 더 많았다.
물론 주택과 주식 포트폴리오의 실제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데리티스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분석이 30년간 꾸준히 투자금을 납입한다는 강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며 "투자는 중단하기 쉽지만 모기지 상환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 "집 못 사도 복리의 시간은 사겠다"
그럼에도 Z세대의 주택 소유 비율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 브로커리지 레드핀 분석에 따르면 19~28세 Z세대의 주택 보유율은 2024년 26.1%에서 2025년 27.1%로 1%포인트 올랐다.
대출 여건이 나아진 지역이나 소형 콘도 공급이 늘어난 시장에서는 '영끌' 첫 내 집 마련 흐름도 여전히 관측된다.
UC샌디에이고에서 Z세대 투자 행태를 연구하는 조시아 쿠퍼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이 세대는 집이든 주식이든 복리의 힘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당장 집을 못 사더라도 시장에서 먼저 '시간'을 사두겠다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