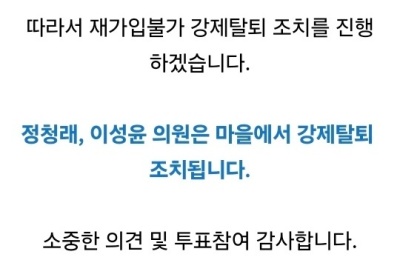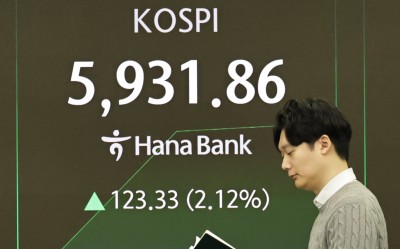[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자국 역량 강화를, 중국은 속도를 무기로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모습이다. K바이오는 이 물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이오는 성장산업을 넘어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계기로 백신 등의 의약품 공급망이 한 국가의 경제 및 외교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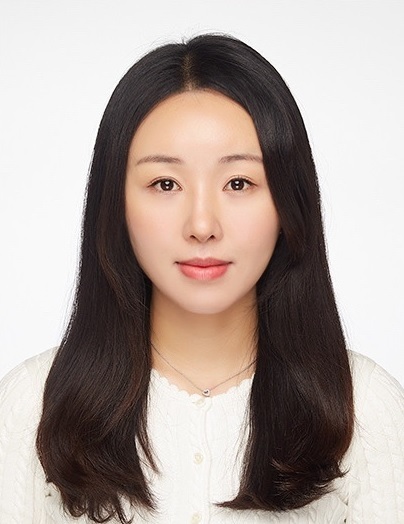
글로벌 의약품 최대 시장인 미국은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중국을 향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좌초됐던 생물보안법 입법을 재추진하며 중국 기업 압박에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미국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자국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약품 관세 카드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했으나, 미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속도와 규모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와 규제 완화 정책으로 혁신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이달 초 중국 정부는 의료보험 데이터 사용과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 등 투자 지원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임상시험 심사 기간도 30일로 줄이며 규제 절차를 완화했다. 중국 증권거래소가 수익성 없는 바이오텍의 상장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R&D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까지 전 주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끊임 없이 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기술력은 성장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 생태계는 낙후돼 있다는 평가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바이오 USA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길어야 5년 정도로 예상한다"며 "중국도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다. 전세계 바이오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올 초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정권이 교체돼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행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K바이오의 갈 길은 아직 멀다. 이 시점에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산업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면, 바이오 패권 지도에서 한국의 이름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