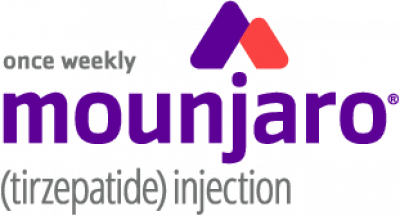선거운동 시작 3일만 소음민원 신고 700건 육박
늦은 밤시간 규제만 있고 횟수·데시벨 규정 없어
“상대방 유세에 묻히면 안돼!” 거리는 큰소리 전쟁
[뉴스핌=김범준 기자] 5월 9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소리가 커졌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총 689건의 선거 관련 소음 민원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흘째인 20일 오전 역시 출근길 지하철역 입구와 통행이 많은 거리 곳곳은 유세차로부터 퍼져나오는 각종 로고송과 홍보영상이 뒤덮었다. 일부 시민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귀를 틀어막고 출근길 바쁜 걸음을 옮겼다.
 |
|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50대 박모씨는 "유세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손님들이 그냥 지나친다. 평소 대비 (손님 수가) 반은 줄은 것 같다"며 울상을 지었다.
박씨는 바로 옆 유세차량에 가서 "음량을 조금 줄여달라, 조금만 떨어진 곳으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음량을 줄이면 다른 후보 유세 소리에 묻힌다"며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주택가와 학교·학원 밀집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정주부 윤미경(30대·서울 동작구)씨는 "왜 아파트 단지까지 유세차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며 "청소하고 환기도 시킬 겸 창문을 열다가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내 닫아버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고모씨 역시 불만이 상당했다. 고씨는 "고시촌(서울 관악구 대학동 일대)에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많은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면서 "2차 시험이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유세 소음은 후보자들의 과열 경쟁인 탓도 있지만 이를 제지하는 법령이 없는 것도 한몫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 휴대용 확성장치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다. 시간 제한만 있을 뿐, 횟수라든가 소음 정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주택가 등에서 데시벨(㏈)에 따라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있지만, 선거운동 차량은 적용받지 않는다.
 |
| 게티이미지뱅크 |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60~75㏈의 소음기준이 있는 반면 공선법에는 없다"며 "국회의원 등 입법자들이 선거를 치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규정하지 않은 명백한 입법불비(立法不備)"라고 비판했다.
후보자 없이 유세차 전광판과 확성기에 똑같은 영상과 음성이 되풀이되는 방식의 효용성도 의문이다.
직장인 강지웅(32·서울 금천구)씨는 "소음 때문에 되레 반감이 생긴다"면서 "뽑고 싶은 후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아예 투표를 안하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시민도 있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대학원 교수(정치학)은 "각종 미디어들이 발달한 요즘, 굳이 현장연설이 없더라도 유권자와 후보자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면서 "공선법 개정과 정치인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라도 바꿀 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