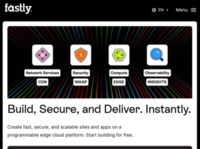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뉴스핌=백현지 기자] 'CEO도 재활용하나.' 최근 증권사 사장에 다른 증권사 사장 출신이 잇따라 영입되자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다. 업계를 떠났던 인물을 중용하는 것은 경험을 활용한다는 포석이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란 의구심도 여전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증권은 신임 사장으로 김신 전 현대증권 사장을 선임했다. 김 사장은 쌍용증권 입사 이후 2004년부터 미래에셋증권으로 둥지를 옮겨 부사장까지 역임했다. 현대증권 사장으로 전격 스카웃됐지만 1년 만에 다시 물러났다.

업계는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한 SK증권이 현대증권에서 중도 이탈했던 김 사장을 영입한 것을 두고 김 사장 개인의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장외파생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서비스부문 대표 등을 역임한 국내 채권 브로커 1세대다.
앞서 지난 9월 KTB투자증권 대표이사직을 맡은 강찬수 부회장 역시 서울증권 사장 출신이다. KTB자산운용 조재민 대표이사 또한 전 KB자산운용 사장을 역임했다.
강 부회장은 지난 1999년 38세로 서울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스타 CEO'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당시 서울증권을 인수했던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이 그를 발탁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으로 바뀐 서울증권 이후 국내 활동이 없다 돌연 돌아와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도 삼성증권 전략기획실 등을 거쳐 2006년 우리투자증권 리테일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주 사장은 우리투자증권과 LG투자증권 합병 이후 조직 개편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신임 사장 중에서는 더 이상 증권업계로 복귀가 힘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시 컴백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무래도 은행이나 다른 업계에서 넘어온 사람보다는 업무적응이 빠르고 조직개편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시 활황기에 증권사를 운영했던 인물들이 역경의 시대를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새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렇다할 경영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인물들이 업계를 떠나있다 다시 CEO를 맡는 경우도 있다"며 "그 시절에 썼던 경영전략이 오늘에 통한다는 보장이 없고, 돌려막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