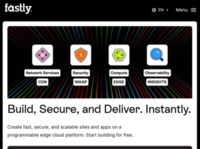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대기업들의 내년 경영 전략에서 채용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고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예일대 경영대학원이 이달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개최한 CEO 행사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기업 경영진의 66%가 내년 인력을 감축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힌 곳은 3분의 1에 그쳤다.
구인 사이트 인디드(Indeed)의 최근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을 가리킨다. 인디드 이코노미스트들은 구인 공고와 성장률 전망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26년 미국 실업률이 약 4.6% 수준에 머물며 고용 증가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파견업체 켈리서비스의 크리스 레이든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는 '지켜보자'는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라며 "눈앞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보다 자본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와 핀테크 업체 차임 파이낸셜(Chime Financial)은 이미 직원 규모를 대체로 현 수준에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쇼피파이의 제프 호프마이스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내년에는 인원수를 늘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이미 2년 넘게 같은 인원 규모를 유지해왔고, 내년에도 인력 관리에서 절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대기업 웰스파고의 찰리 샤프 CEO도 이달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직원 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웰스파고 인력은 비용 절감과 조직 개편 여파로 2019년 약 27만 5000명에서 현재 약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올 한 해 동안 의료·교육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아마존, 버라이즌, 타깃, UPS 등 굵직한 기업들이 최근 수개월간 사무직 인력을 잇달아 줄이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구조조정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는 예일대 행사에서 "모두가 자기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 농담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의 채용 중단이 단기 조정에 그칠지, 보다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용 문이 좁아지면서 근로자들의 '자리 지키기' 현상도 뚜렷해졌다.
IBM의 아빈드 크리슈나 CEO는 직원 이탈률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IBM의 자발적 퇴사율은 현재 2% 미만으로, 통상적인 7%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크리슈나 CEO는 "사람들이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퇴사자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일제히 꽁꽁 얼어붙은 것은 아니다.
인디드의 로라 울리치 경제연구 책임자는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고임금 분야에서 신규 채용이 특히 부진한 반면, 의료와 건설 분야는 구인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