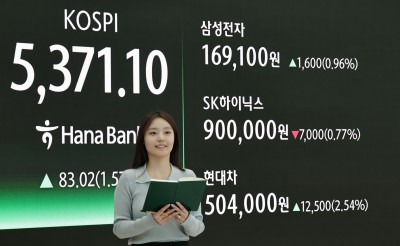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최대 5배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및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 피해 입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차례대로 도입된다.
그동안 대기업 등에 피해를 입고도 증거 확보와 손해 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권리가 보호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성장전략 테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자료나 특허,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하고,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와 자료 보전까지 가능해진다.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소송에서 도움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송 당사자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기관에도 적용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조사 자료를 법원이 직접 제출받을 수 있다.
증거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에는 과태료로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금의 다섯 배 수준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자료 미제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신고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기술탈취 사실을 직접 피해기업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바꿔 누구든 제보가 가능해지고, 익명 신고가 허용된다.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됐다. 기술유용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는 강화된 직권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정 권고 불이행 시 공표만 가능했던 현재 규정을 바꿔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확장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기술유출 목적으로 이직 알선, 재유출, 해킹 등 신종 수법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경우에는 브로커 행위와 미신고 수출까지 단속 대상이 늘어나며, 벌금은 기존 최대 15억원에서 6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3배에서 5배로 대폭 늘어난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된다. 피해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되도록 손해액 산정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사한 R&D 사례와 비교 가능한 비용 정보를 피해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법원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손해 산정을 의뢰할 수 있고, 향후에는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가칭)'를 별도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전산적 보호시스템 구축 지원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도 신설된다.
가칭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설치해 피해 신고부터 조사,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1인 조정부'와 직권조정 절차도 신설된다. 당사자간 합의가 명백하거나 조정예정가액 5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침해 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기술탈취를 막는 울타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