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 연습장에서 볼 때리는 것만 보고 한번 붙자고 할 일은 아니다. 스윙이 엉성하다고 내기골프를 제안하는 것도 금물이다. 스코어가 구력 속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520야드 파5홀에서 P씨는 파온을 시켰다. 드라이버도 페어웨이 중앙으로 잘 날아갔다. 그것도 멀리. 두 번째 샷도 그린에서 90야드까지 날아갔다. 피칭으로 친 세 번째 샷도 홀에서 좀 멀긴 하지만 그린에 잘 올라갔다. 홀까지는 약 4m. 파가 확정적이었다.
하지만 P씨는 첫 퍼트가 홀에서 1m나 짧았다. 치다 만 것. 기분이 확 상한 P씨는 이 두 번째 파 퍼트마저 실패해 보기를 하고 말았다.
520야드를 3타 만에 와서 단 4m를 3번이나 친 것이다.
반면 K씨는 드라이버 샷부터 죽을 쒔다. 구력이 20년인 K씨는 거의 볼을 굴리다시피 하며 4온을 시켰다. K씨는 거리가 나지 않는 만큼 OB나 러프로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았다.
K씨도 홀에서 4m에 볼을 올려놓았다. 여기서 K씨는 1퍼트로 파를 잡았다. P씨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파였다. 그러나 분명 파다.
P씨의 보기와 K씨의 파는 구력에서 오는 차이였다. 어설픈 골프는 내지르길 좋아한다. 아주 정확한 샷이 요구되는 홀에서도 드라이버를 잡고 힘껏 때린다. 결과는 뻔하다. OB 아니면 깊은 러프다.
하지만 관록의 골프는 다르다. 그린위에서 게임이 죽인다. 잘 보라. 퍼팅 나쁜 싱글골퍼는 없다. 퍼팅 좋은 보기플레이어가 드문 것과 같다.
골프를 잘 하는 것 같은 데 스코어가 나쁜 골퍼가 있다. 이런 골퍼는 그린위에서 게임부터 점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도 2퍼트로 막겠다는 골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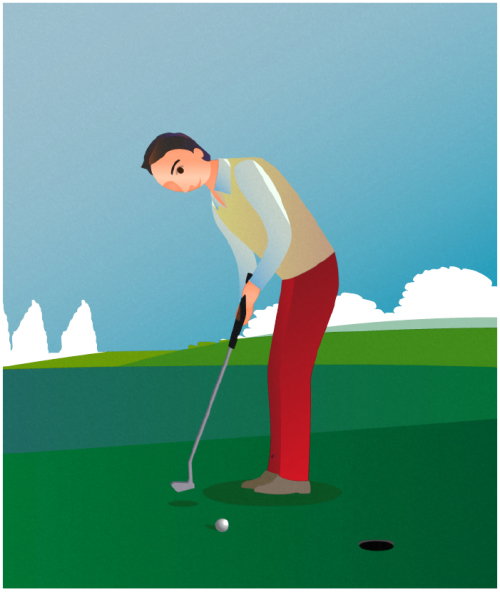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