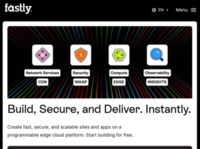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영원할 줄 알았던 회사였는데... 해체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해체된 한 대기업의 전직 임원 말이다. 이 기업은 한때 국가 대표 브랜드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분식회계 및 총수의 비리, 계열사간 동반 부실로 인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해체됐다. 구태의연하고, 아랫 돌 빼 윗 돌 괘는 식의 경영이 낳은 결과다. 이제는 일부 브랜드만 타 기업에 인수되면서 흔적이 남아 있다.
반면,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신진 기업들도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틈새 공략에 성공한 사례다. 시대의 기류에 제대로 편승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외환위기와 함께 요동친 재계 서열
오늘날 재계에는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조명 받는 기업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세월의 풍파 속에 사라진 기업들도 여럿이다. 정부가 최초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한 1987년 재계 서열을 살펴보면 오늘날 생소한 대기업집단도 적지 않다.
당시 재계서열 2위인 대우그룹을 비롯해, 5위 쌍용그룹, 11위 동아건설그룹, 12위 한일합섬그룹, 13위 기아그룹 등 굴지의 대기업집단은 현재 극도로 사세가 축소되거나 뿔뿔히 흩어져 타 기업에 인수됐다.
이 외에도 삼미그룹, 한양그룹, 극동건설그룹, 해태그룹 등 당시 재계30대 그룹에 속하던 기업집단 중 오늘날 30대 그룹에 남아있는 기업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30대 그룹의 명단이 가장 큰 폭으로 요동친 시기는 바로 외환위기 때였다.
1998년까지만 해도 자동차, 전자, 중공업, 통신 등 37개 계열사로 재계서열 3위에 이름을 올렸던 대우그룹은 이듬해인 1999년 재계서열 2위로 뛰어올랐지만 이것이 대우그룹 역사의 마지막 순위가 됐다.
대우그룹은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1997년부터 차입을 통해 외형을 팽창해오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1998년 당시 대우그룹의 부채비율은 600% 이상이었다. 결국 GM-대우차 협상, 삼성차-대우차 빅딜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1999년 8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만다.
당시 김우중 대우그룹 창업주는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횡령 및 국외 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대우그룹의 몰락은 ‘대마불사’라는 재계의 불문율을 깼다는 점에서 세간에 충격이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외환위기 때 사라진 기업은 적지 않았다. 1997년 1월 당시 재계서열 14위의 한보그룹이 도산했고, 3월에는 26위의 삼미그룹이, 9월 19위의 진로그룹, 10월에는 8위의 기아차그룹, 25위의 뉴코아그룹, 24위 해태그룹, 12위 한라그룹이 잇따라 무너졌다.
이어 2000년 당시 재계순위 14위의 동아그룹은 핵심 계열사 동아건설의 부도로 2001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시 재계 서열은 하루가 가기 무섭게 바뀌는 상황이었다. 한 그룹이 쓰러지는가 하면, 다른 그룹이 또 쓰러지는 업계의 일대 풍파가 일었다. 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한 실업자만 100만명에 달했을 정도다.
이들 그룹은 축적된 기술도 없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신산업에 뛰어들면서 전적으로 외부차입에 의존, 무모한 도박을 벌이다가 무너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실타래처럼 얽힌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 및 부당내부거래로 부실기업의 명을 연장시키다가 결국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로 이어졌다는 점도 놀랍도록 흡사하다.
하지만 무너지는 기업이 있었다면 반대로 새로 등장하는 기업집단도 생겨났다.
◆ 경영의 환경변화, 코드를 읽어라
2010년 현재, 재계 서열에서 가장 돋보이는 신진 기업집단으로는 STX그룹을 빼놓을 수 없다.
STX그룹은 2000년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한누리컨소시엄에 인수된 쌍용중공업을 당시 쌍용중공업 대표이사이던 현재의 강덕수 STX 회장이 인수하면서 점차 세를 확대했다. 오늘날 STX그룹의 재계 서열은 14위, 16개 계열사와 자산총액 20조 90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TX그룹은 신진 기업의 대표격으로 급성장 키워드에서 단연 손꼽히는 곳"이라며 "블루오션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세를 확장했다"고 풀이했다.
STX그룹이 자생한 사례라고 하다면, 많은 수의 신진 30대 그룹은 대부분 ‘계열분리’를 통해 성장했다.
재계 서열 2위의 현대자동차그룹을 필두로, 7위의 GS그룹, 8위 현대중공업그룹, 15위 LS그룹, 18위 CJ그룹, 22위 신세계그룹 등은 모두 기존 재계 서열 상위권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분리한 이른바 ‘친인척’ 그룹이다.
그러나 계열분리를 한 만큼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분리 당시보다 자산규모와 계열사가 크게 늘어났다.
그 외에 재계 서열 6위 포스코, 11위 KT 등은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30대 그룹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6위 대우조선해양, 17위 하이닉스, 23위 현대건설 등은 워크아웃 등의 이유로 채권단 관리하에 넘어가 정상화가 된 경우다.
최충규 한국경제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환경, 사회, 지정학적 환경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바로바로 탈락되니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김종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원은 “과거에 30년 동안 변한 것보다 앞으로는 3년내에 더 많은 것이 변할 수도 있다”며 “변화의 사이클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년간 재계 순위 변동 이상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는 얘기.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경영 환경에서 변화의 코드를 누가 제대로, 그리고 빨리 읽느냐에 따라 흥망사가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며 갖춰진 현재의 30대그룹. 그 명단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ikh@newspim.co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