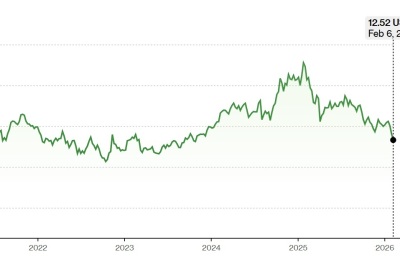인간 중심과 기술 자율성의 대립
책임 전환과 역할 분담 중요성 대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의가 어느 순간 '도입'에서 '재설계'라는 단어로 옮겨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사회와 조직, 노동과 교육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질문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그 설계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며, 어떤 한계를 갖는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AI가 인간의 판단 아래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기술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회보다는, 인간이 책임과 통제를 유지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은 크지 않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 '판단의 자리'는 추상적이지 않다. 판단에는 지식과 정보, 시간과 권한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여기에서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곧바로 사회 전체를 포괄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AI가 돌봄과 헬스케어, 교육 등 인간의 삶 깊숙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흐름도 비슷하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확장한다는 설명도 설득력은 얻는다. 다만 그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그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인간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산업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르네상스형 인재' 역시 흥미로운 개념이다. 기술을 이해하면서도 비즈니스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판단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해진다는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런데도 이 인재상이 사회 전체의 해법처럼 제시될 때는 다른 질문이 뒤따른다. 모든 사람이 그런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나. 그렇지 못한 다수는 어떤 경로를 갖게 되는가.
재설계가 기회의 확장이 되려면, 동시에 탈락의 경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기업과 조직 차원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필요하다. AI 전략을 기술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의 문제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보인다. 그러나 그 결정이 조직 내부의 권한 구조와 책임 배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변화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설계는 언제나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AI 사회 재설계 논의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기술의 가능성만큼이나 설계의 조건과 전제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할 수 있는 것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것, 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진 재설계는 낙관론에 불과하다.
AI는 이미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선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설계가 누구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확인해야 하는 일이다. 기술이 사회를 바꾸는 속도만큼,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속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