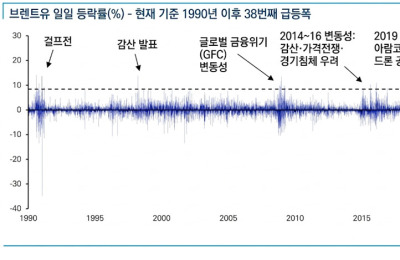그렇긴 하지만 집으로 무겁게 들어서는 아내의 가냘픈 의지 속에는, 희미하나마 꺼지지 않은 호롱불이 담겨 있었다. 그 약한 호롱불은, 그 옛날 전쟁 중에 남편마저 잃은채 무너진 판자때기 위에 걸터앉아 가엾은 어린 자식들에게 죽을 끓여먹이는 내 할머니 가슴속의 호롱불과도 닮아 있었다. 그 호롱불이 아니었던들 굶어 죽었거나 고아원에 끌려갔을. 그리고 그 약한 호롱불은, 무거운 빚더미를 끌어안고 쓰러지면서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 하얀 쌀밥을 앉히시던 내 어머니의 호롱불과도 닮아 있었다.
그 호롱불 주위로, 딸아이들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노랑 나방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겨우 찾아가는 안정감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거친 파도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그리고 병이 깊은 아내에게,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고, 이 세상도 병이 들었다고 말해주기엔, 아내는 너무 지쳐 있었다.
경제판이건 정치판이건 국제판이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갔다. 그 물결에 휩쓸려 나도 국제금융팀에서 지점으로 밀려났다. 삼십대 후반 나이, 만년 대리로, 그 지겨운 객장으로 또다시 밀려버린 것이다. 객장은 본사보다 훨씬 엉망이었다. 재고와 적자의 악순환에 빠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렇잖아도 지친 아내와 나를 계속 황폐화시켜갔다. 돌파구로 삼은 것이 덫이 되어버린 꼴이었다. 어머니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들어준 보험을 시작으로 해서, 결혼반지, 패물들을 떨이하듯 팔아치워야 했다. 그래도 모자랐다. 자본주의의 끝없는 허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도 그 이상을 요구했고 내 목을 겨냥하며 쳐들어왔다.
아내는 집의 공기를 못견뎌 자주 진주로 떠났다.
날씨가 차가운 일요일이었다. 아이들을 집에서 보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롯데리아에서 먹고 싶은 것들을 사주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다. 놀 만큼 논 다음 집에 돌아가려고 지하도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경혜는 뭔가에 시선을 뺏겨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텔레토비, 텔레토비 사줘”
나는 텔레토비가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사주려고 생각한 것은 이미 다 사줬기에, 그 이상은 절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다들 마음이 심하게 오그라져 있던 때였다. 그리고 한번 오그라진 마음은 여간해서는 다시 펴지지 않았다. 아내에게 느끼는 것도 그것이었다. 아직도 나에 대해, 우그러진 캔의 내부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집에 같이 있으면 불편함을 느껴 자꾸 밖으로 돌려 하는 것 같았다,
고집이 센 경혜는 텔레토비 인형 앞을 떠날줄 몰랐다. 십 분, 이십 분. 지치면 나오겠지, 주혜를 데리고 지하도 밖으로 나가 숨어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다. 삼십 분, 사십 분, 오십 분. 날씨는 지독히도 추웠다. 아무리 기다려도, 텔레토비와 장사꾼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멀뚱멀뚱 서 있을뿐 나올 생각도 않고 있었다.
그 순간, 꼭 나를 보는 듯했다. 차가운 눈 속에 맨발로 들어가, 발이 시퍼렇게 얼도록 꼼짝없이 버티고 서 있던 경혜 나이의 나. 스케이트를 사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안 되자, 양말도 벗어버린 채 눈 속에 들어가버린 것이다. 밖으로 끄집어내면 또 달려가 들어갔다. 끄집어내면, 또 들어가고....결국 아버지가 양보했다. 나중에 생각하니 집이 어려웠을 때였다. 그때의 아버지 마음이, 불쑥 느껴졌다.....갑자기 그애가 안쓰러워져, 지하도를 달려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