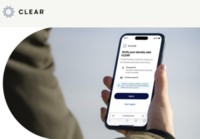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봄날의 작약도. 찰랑이는 바닷물과 수면에 찬란하게 부서지는 맑은 햇살. 수평선을 바라보며 함께 포개 앉은 암록색 바위섬. 우리 바로 위를 끼륵끼륵 날던 갈매기들과 그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밝게 웃던 너의 청아한 목소리. 붉게 타오르던 작약꽃들....그리고 우리 등 뒤로 삼킬듯이 무섭게 들이차 있던 바닷물.
현주
네 이름을 자꾸 부르니 내 혀에 윤기가 돌고 그대가 파르르 날아올 것 같다. 아픔 속을 걷는 그대. 너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빨간 작약꽃 피워내길 바란다. 인색한 애정 속에 나는 공연히 콩이나 찧는 절구통처럼 굳어갔고, 그러한 나를 보며 그대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행복의 연출을 했는가. 이젠 그대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리라. 고급 필름이 든 카메라가 되어 그대 안의 멍, 비애, 고독, 그리움....다 찍고 싶다.
찻집 창유리 너머 LG25시, 포장마차, 문방구, 숯불구이집이 보인다. 우리가 함께 볼 땐 대수롭지 않은 풍경이더니, 너 없이, 물기 없는 눈으로 보니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른다. 추억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거리를 걸으며 아이들과 오뎅도 사먹고, 스티커도 사 주고 해야 하는데. 너와 마시던 모과차 한 잔, 하얀 쌀밥, 청국장. 냉이국, 동동주.....단순한 사물들이 꽉 찬 의미들로 떠올라 내 가슴 속에 별이 된다. 이 아름다운 별들을 달아주지 못하고 진흙이나 안겨주었던, 지난 세월이 부끄러워진다. 현주. 너의 아픔 속에서 나의 아픔을 느끼며, 내 본성을 되찾는 것 같다. 자꾸 밝아지고, 그 밝아짐으로 너의 전신을 비추고 싶다. 너를 향한 그리움 속에 익사할 것 같다.
10.12. 밤 10시 반. 집에서
이제야 그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같다. 내 눈망울을 뒤집어쓴 독한 껍질이 벗겨지고, 사랑의 향기 속에 온유한 그대가 보인다. 많이 말랐구나. 힘들어했구나. 내 어찌 그대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참아내는 것이 약간의 불편이거나 눌러 삼키면 대강 가라앉는 것이려니 여겼는데, 이렇게 멍들어버리다니.
진실이 아니었다. 직장생활 십 년. 이리저리 발버둥 치며 쫓아 다닌 것이 결국 허상의 굴레였단 말인가. 미혹의 세월이었다. 지금껏 이뤄낸 것도 없고 오히려 잃기만 했어도, 그대 하나 찾았으면 됐다. 바로 곁에서 매일 웃고 바지런 떨던 무대 뒤에, 그대 영혼의 온갖 슬픈 잡동사니 소품들이 보인다.
내 앞에 멍든 그대를 느끼면서, 다시금 내 삶의 존립 이유와 설 자리를 정한다.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우연한 그 순간부터 난 사랑을 직감했고 당연히 내 삶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대를 선택한 적이 없다. 그대는 내게 ‘선택’이라는 형식을 띤 존재가 아니었다. 그대와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다. 약혼이니 결혼이니 하는 금줄들이 우리의 물줄기에 간간히 마디를 잡을 뿐이었다.
오늘 낮, 숙의 집에서 며칠 쉬고 오겠다고 네가 떠난 후, 불길함과 공허가 짙게 감도는 방안을 혼자 몇 시간이고 빙빙 돌다가 장롱을 열어보았다. 훅, 진한 향기와 함께, 너의 형체를 담았던 원피스, 블라우스, 치마.....그 옷들을 보는 순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를 바라보는 듯한 전율이 짜릿하게 훑고 지나가는 동안에도 색깔이 새삼 곱다는 의아함에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