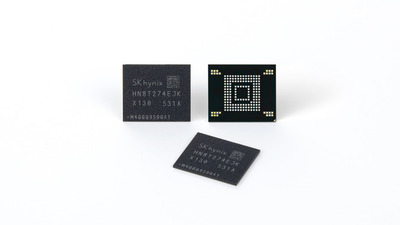[뉴스핌=이영기 기자] 우리금융이 자랑하던 '원두(OneDo)혁신'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면서 '前회장 흔적지우기'가 본격화 하고 있다.
비록 이팔성 전 회장이 도입했지만 이 방안은 자발적인 상향식으로 민영화을 앞둔 우리금융의 가치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윤 실장은 원두혁신의 실무총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되돌아 오면서 원두혁신은 이제 모습이 더 희미해진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이순우 회장이 취임하면서 추진조직인 경영혁실실을 시너지추진부로 통합하면서 원두혁신은 종적을 감추기 시작했다.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는 "그간 내부문서에도 원두혁신이라는 문구를 새겨넣곤 했는데 이제는 더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간 원두혁신을 실무적으로 총괄지휘하던 전 혁신실장도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겨 추진체가 없어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불과 3개월전까지만 해도 우리금융은 원두혁신을 미국 컬럼비아 MBA과정에서 연구사례로 활용한다고 홍보했다.
원두혁신은 '직원 개개인(One)이 혁신을 실행(Do)해 1등이 되자'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된 후 이 운동은 3년간 23만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을 통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기회비용 등 총 5198억원의 재무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우리금융은 평가했다.
원두혁신의 주된 목표가 전략적 비용절감인 만큼 단순경비와 예산절감 뿐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차원에서 우리금융 조직원에게 대물림을 할 수 있는 문화로 정착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 은행 전문가는 "직원들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bottom up)인 점에서 이 운동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체화(Built-in)된 조직문화로 인정되면 M&A에서 기업가치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종적을 감추는 원두혁신은 별의미 없는 단순한 '전임 회장 흔적 지우기'로 인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회장들의 전임 회장 흔적 지우기 중 하나로 회자되는 KDB산업은행의 다이렉트뱅킹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이다.
강만수 전 KDB금융 회장이 공을 들인 다이렉트뱅킹은 조만간 시행될 조직개편에서 추진조직이 격하되면서 명맥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강 전 회장시절의 민영화 화두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매진해야 하는 산업은행 입장에서 보면 홍기택 회장의 이런 조직개편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반면 우리금융에서 원두혁신의 실종은 능동적인 비용절감 등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거둬내야할 타당한 바탕을 찾기가 어렵다.
실제 이순우 회장도 취임사에서 "민영화를 위해 그룹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전 계열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 매력적인 금융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룹가치 제고를 위해 취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으로 "낭비와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고 제대로 된 영업조직을 갖춰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었다.
이런 이 회장의 언급은 원두혁신 실종이 기존의 '통제'에서 '지원'으로의 전환이라는 조직개편 취지에 맞춘 것이라는 설명과도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다.
앞의 은행 전문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배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 가"라며 "민영화를 앞둔 금융그룹의 회장으로 너무 의욕적인 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도 한 때 이 회장의 이런 의욕적인 면을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다.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의 민영화 방안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6월 중순 이 회장은 우리투자증권의 매각에 대해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민영화구도가 잡히기도 전에 이런 발언을 하는 이순우 행장의 의중이 궁금하다"면서 "이 회장의 면면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