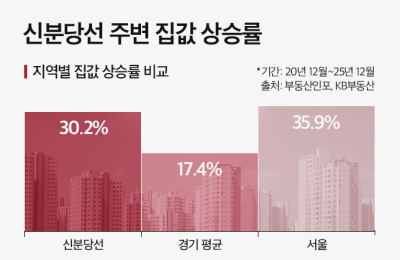[뉴스핌=원정희 기자] 은행들이 스스로 M&A 주체로 나서 경쟁은행을 압도하려면 그 만큼 실탄을 싸게 많이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금융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민간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먹히지 않기 위한 요건으로 자본조달 능력, 인수를 추진할 수 있는 경영진의 능력과 주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의 기대효과가 커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요즘같은 때는 대외환경에 대한 완충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M&A를 자본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단순히 A은행과 B은행의 자본을 합친 수준이거나 M&A프리미엄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소용없다"며 "M&A로 '1+1' 이상의 규모만큼 자본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마냥 M&A에 집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도 "정책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금조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 재무투자자 유치 등 자금확보 방안 절실
가령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은행 증권 등 대부분의 자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은행 증권 등 대형 자회사를 갖추고 있는 종합금융그룹인 우리금융을 인수하는게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금융계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하나금융의 지난 3월말 현재 자기자본은 9조원으로 이미 출자한 것을 제외하면 남은 출자한도는 3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시가총액도 9조원 남짓이다. 그나마 법인세 1조7000억원 납부가 최근 없던일로 되면서 실탄 비축에 여유가 생겼다.
정부가 우리금융 소수지분을 매각하고 지배지분인 50%+1주를 어떤식으로 매각해 민영화할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 지분 50%만 인수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14조원이 넘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7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하면 그 가격은 10조원 가까이 달할 수 있어 하나금융의 출자여력으로선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하나금융은 추가적인 자본 증가 혹은 재무적 투자자 유치 등의 자금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
아울러 자회사들이 꾸준히, 충분한 이익을 내 지주사의 이익을 늘려줘야 하지만 은행권 전체적으로 이익성장이 정체되다시피 하고 있다. 향후 이익 전망 또한 긍정적이지 않다.
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도 이익비중이 주력자회사인 은행쪽에 쏠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레 큰 이익을 내 지주사의 자본을 늘리는 것 역시 쉽지 않은 형편이다.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후 상대적으로 M&A가 적어 8조원 수준의 출자한도가 남아있다. 물론 정부의 민영화 방안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투자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M&A의 주체가 돼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국민銀, 지주출범 초 출자여력 마련해야
국민은행 또한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30%까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자기자본은 15조9000억원으로 약 4조7866억원의 투자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는 9월 지주사를 출범할 예정이어서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오히려 쪼그라들 수 있다. 지주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를 출자할 수 있지만 지주 설립 초기엔 출자한도가 제로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출범 초 자회사 주식과 지주 주식을 교환하면서 이미 자회사에 100% 출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출자한도가 남아 있지 않다. 향후 자회사들이 이익을 내고 배당을 받아야만 자기자본이 늘어나면서 추가 출자한도가 생긴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경우 우선주 발행 등의 증자를 통해 M&A에 나서야 하는 등으로 실탄에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주 출범 전인 오는 9월 이전에 M&A가 이뤄져야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상 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인다.
M&A가 예상되는 은행들은 여럿 있다. 그러나 이 물건들이 어느 시점에 시장에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거나 자금확보 방안을 마련해 M&A대상이 언제든 시장에 나올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