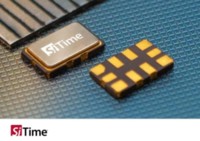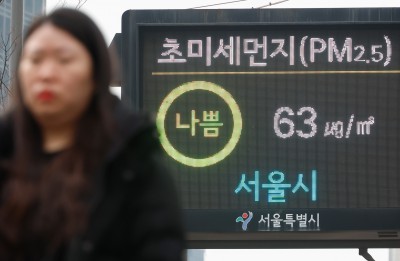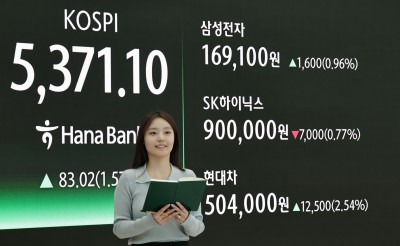[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병원을 돌며 서류를 떼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실손24' 앱을 통해 병원·약국의 영수증과 처방전을 바로 보험사로 전송하면, 클릭 한 번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지난달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청구 전산화가 전면 확대됐지만, 참여율은 10%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종이 서류를 들고 다녀야 하는 셈이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기술이 아니라 참여의 문제다.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연결하려면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이 연계돼야 하는데, 일부 EMR업체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유사한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공공 플랫폼 '실손24'와의 연계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EMR 카르텔'이 디지털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의료현장의 현실적 제약도 있다. 자체 개발 역량이 있는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의원·약국은 외부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스템 전환비용, 인력교육, 유지관리비 등 현실적인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가 서버 구축비나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낮다. 많은 중소 의료기관에서 "굳이 참여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제도 설계는 완성됐지만, 참여 구조는 미완성인 시스템이 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으면 불편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보험금 청구를 더 쉽고 빠르게 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기본권이다. 제도의 본질은 '소비자 편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참여 EMR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종합병원 평가에 '청구 전산화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여 기관에는 보증료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유만으로는 시장의 벽을 넘기 어렵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실행력이다. EMR업체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선택'이 아닌 '기본 절차'로 만들어야 한다.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 보상체계와 불이익 구조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참여율 10%로는 디지털 전환도, 소비자 편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실손보험 전산화가 진짜로 작동하려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