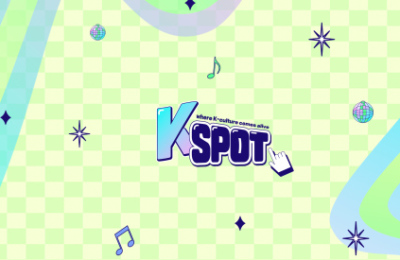그녀의 분노와 질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을 느꼈다. 일단 말의 방향이 잡히니, 말의 물결이 그 방향으로 풍요롭게 흘러나갔다. 언젠가 혁과 광릉 수목원 풀밭에 누워, 마음 속에 감춘 비밀 이야기들을 해가 저물도록 풀어내던 적이 있었다.
망각의 세월에 깎이지 않고 맨처음 원석의 빛깔 그대로 가슴 깊은 곳에 저장된 이야기. 일상의 대화 속에 흘려보내기엔 아까운, 내면의 화로 속에 정제되고 정제된 연금의 언어들. 누구와도 공감하기 어려운 그 가슴 조이는 이야기들을,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무한정 지평을 열어나가며 막 솟아나는 샘물의 탄력으로 펼쳐나갈 때의 행복감....혁과 남김없이 털어놓은 후엔 둘 다 까무러치도록 후련하게 탈진되어, 풀밭에 그대로 쓰러져 청정무공해의 공기만을 배가 터지도록 마시고 있었다. 그때 나눈 이야기 중엔, 더 심금을 태우는 얘기도 있었지만, 첫사랑에 대한 순정한 기억도 들어 있었다.
최영호는 내 아내에게, 손짓이 몹시 아름답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제스처 쓰는 아내의 손짓이 아름답고 세련되어 보였다. 저것이 사랑의 눈길인가. 내가 무심코 보아 넘긴 아내의 손짓이, 아내의 청춘시절 누군가에 의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술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게도 첫사랑이 있었다. 어쩌면 아내의 이번 사건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의 자락이 깔릴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1979년. 대학 1학년 첫 미팅. 최루탄 가스와, 시도 때도 없이 감도는 휴교의 적막한 공기가 캠퍼스를 번갈아 뒤덮기 직전이었던 맑은 봄날. 작게 웃는 미소와 봄바람 같은 단아함으로 나를 온통 흔들어버린 여자. 혜진.....사실 몇 개월 전 나도,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아주 우연히.
지하철 2호선 안에서였다. 나의 방황이 극심하던 때로 과장 진급에서 내리 세 번째 밀려난 직후였다. 대리 말기에 지점에서 본사, 그것도 좋은 부서라는 인수영업부로 옮겨 TO에 밀려 첫 번째 탈락을 했고 거기까지는 수긍하고 있었다. 탈락된 댓가로 국제금융팀에 배속되어 승진이 기대되었는데 K그룹 회장의 친척이 돌연히 전입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두 번째 탈락을 겪었다.
억울했지만 아무런 방도가 없었다. 세 번째는 안심하고 있었다. 실적도 괜찮았고, 캠페인도 상위권을 유지했고, 주변 평판도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인사발표 바로 며칠 전, 한보철강의 부도가 터진 것이다. 이 사건은 그나마 위태롭게 버티던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시궁창으로 밀어 넣은 동시에 국내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극도로 악화시킨 사건이었는데, 우리 회사와도 관계가 있었다.
즉 한보철강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우리 본부가 거액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회사의 막대한 손실, 인사상의 불똥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사실은 그 채권이 해외 CB가 아닌 국내 CB이기에 본부 내에서도 국내팀과 관련된 손실인데도 엉뚱하게도 인사상 불이익은 내가 속한 국제팀에서 주로 당했다.
조직이란 그런 것이다. 그 후유증으로, 며칠간은 일도 팽개치고 밖으로 쏘다녔다. 실권이 없던 부장도 미안했던지 날 내버려 두었다. 그런 심경으로 도시를 유령처럼 떠다니던 어느 날, 왠지 주혜가 보고 싶어져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려, 잠시 안아주고 과자도 사주고 집에 보낸 다음 회사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이었다.
“진석아.”
들어선 순간,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자가 스르르 일어나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 순간의 흥분과 솟구치는 감회를 어찌 말로 표현하랴. 경황없이 서로 들떠 얘기를 나누다가, 시청역에서 내려 차를 마시고, 두 달 정도 흐른 지난 5월 다시 한 번 만날 기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