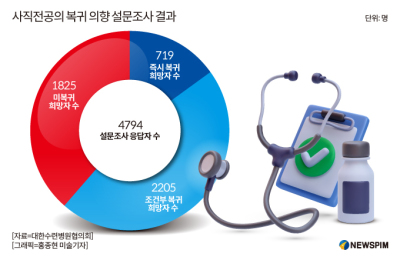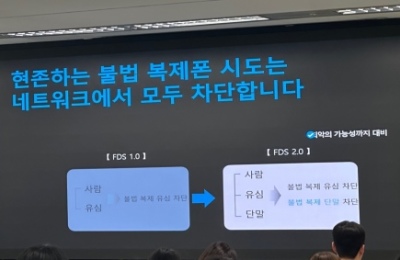어릴적 우리 동네엔 성황당(城隍堂, 우리말 서낭당)이 있었다. 몇백년 된 느티나무였는데, 늘 경외심의 대상이었다. 동네밖에 상여집이 있었다. 집에서 학교로 오가는 길목 어귀에 있었는데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아예 그 곳은 에둘러 다녔다.
이웃집 처녀의 죽음을 보았다. 농약을 먹고 음독 자살한 것 이었다. 그후론 이웃집에 가지 못했다. TV에서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았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과 삼지창을 들고 도무(跳舞)했다. 그런 무당화면 위로 성황당, 상여집, 음독자살 이웃집 처녀의 상(相)이 덮혀졌다.
대학원 동창생 모임이 있었다. 술이 돌았다. 동창생 중 민속 예술계에 종사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 전통예술의 줄기를 더듬어 들어가면 무당의 굿판으로 뿌리가 연결돼 있다.” 큰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어릴적 우리집에서 수시로 했던 굿판이 떠올랐다. 작은 누나와 함께 무당들이 부르던 소리를 흉내냈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누런 햇살이 다북하게 내리던 어느 가을날 진도 씻김 굿을 보기 위해 무작정 진도로 떠났다. 시원하게 뚫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을 햇살만큼 풍요로운 맘으로 목포시내를 통과해 진도 울돌목에 도착했을 땐 중화참이었다.
말로만 듣던 울돌목 물살이 장마철 계곡물 보다 빠르고 거칠게 흘렀다. 가슴속 응어리를 바다위에 던졌다. 물살은 내 응어리를 단숨에 삼켰다. 속이 텅 비워 졌다. 이제 새로운 것을 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굿판으로 향했다. 마음이 소풍에 나선 초등학생처럼 오줌마렵게 설레였다.
장구, 징, 괭가리, 피리, 아쟁, 해금, 거문고, 대금이 울렸다. 육자배기 토리의 무가(巫歌)가 들렸다. 놋주발 소리에 제석님이 강림하고 계셨다. 당골(소리하는 무녀)과 고인(鼓人, 당골을 뒷바라지하는 남자 악사)의 어깨 위에 한과 신명이 어우러져 복(福)을 청하는 흥으로 승화되고 있었다. 당골이 관객들에게 복을 의미하는 쌀을 뿌렸다. 파란 지폐가 추풍낙엽같이 흩날렸다.

굿판은 GOOD판이었다.
씻김 굿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천도시키기 위해 벌이는 굿이다. 망자를 위한 굿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전라도 지역의 사령(死靈)굿을 씻김굿이라고 한다.
‘씻김’이란 말은 이승에 살 때 원한을 지우고 씻어 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굿 도중에 맑은 물, 쑥물, 향물로 망자의 영혼을 씻어 주는 ‘씻김’을 하는데, 그것이 굿 전체의 이름이 되었다.
씻김 굿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초상이 났을 때 관을 곁에 두고 하는 곽머리 씻김 굿, 소상(小喪)·대상(大喪)날 하는 소상·대상 씻김 굿, 특정 날을 받아 여러 명의 조상과 친지의 넋을 초청해 하는 날받이 굿, 초분(草墳)을 해체하고 본장(本葬) 때 하는 굿, 객사한 자의 넋을 위하는 혼맞이 굿, 물에 빠져 죽은 이를 위로하는 넋건지기 굿, 죽은자의 혼을 결혼시키는 저승 혼사 굿 등이 있다.
씻김 굿은 그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고 가감되기도 한다.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 72호로 등재된 박병천·정숙자 본 구성을 기준하여 보면 안당(집의 최고신인 성주신에게 굿을 하게된 내력을 고하는 의식) 초가망석(조상을 청하는 의식) 손님 굿(병없기를 비는 의식) 제석 굿(복덕을 축원하는 의식) 액 풀이(영혼을 위로하는 의식) 고풀이(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의식) 씻김(망자의 원한을 씻어 주는 의식) 넋 올리기(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 길닦음(저승길을 내주는 의식) 중천(굿판에 참석한 모든 잡신을 달래는 의식) 순으로 통상 1박 2일 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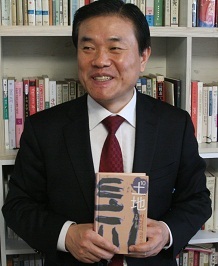 |
| 변상문 |
다음 날 늦은 오후 굿판이 끝났다. 울돌목 횟집에서 뒤풀이가 이어졌다. 술이 돌았고 소리가 돌았고 춤이 돌았다. 식당의 모든 손님이 한덩어리가 되어 놀았다.
진도 씻김 굿을 세계 제일의 민속음악으로 자리매김시키고 먼저 저승으로 떠나 간 고인(鼓人) 박병천, 당골 김대례의 구음 살풀이와 중타령이 밤하늘 별빛과 함께 눈 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