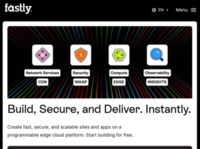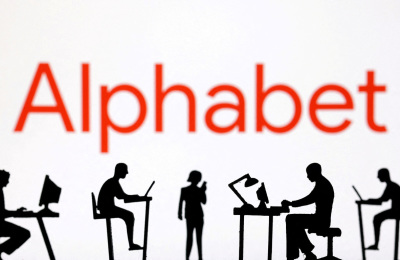- 금감원 1분기내 구간별 충당금 적립률 강화
- 카드사 단기 부담 속 소비수단 위축 우려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감독당국이 1분기 중으로 카드사들에게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기준을 올릴 예정이어서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 끼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소비자 대출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다가 정한 날에 현찰로 갚는 신용판매와 소비자 대출에 대해 같은 비율로 충당금을 쌓는 것은 자산건전성을 꾀하기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카드사들이 지난 2003년 이른바 카드대란 이후 대손충당금을 넉넉히 쌓아뒀다고 주장하지만 당국 계획이 실행되면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영상 자금부담을 느끼는 만큼 카드사들이 각종 한도 축소에 나설 경우 회사로서는 매출이 줄고 고객들로서는 소비수단이 위축될 수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각 전업계카드사 대손충당금적립율은 100%를 조금 웃돌고 있다.
금감원이 설정한 의무 적립액 기준에 비해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 가장 높은 곳은 하나SK카드로 107.98%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카드가 107.83%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어 롯데카드가 105.07%, 신한카드가 104.17%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삼성카드가 100.81%로 상대적으로 낮다.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현재 각 카드사는 △'정상' 분류 자산의 1.5% 이상 △'요주의' 분류 자산의 15% 이상 △'고정' 분류 자산의 20% 이상 △'회수의문' 자산의 60% 이상 △'추정손실' 자산의 10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현행보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구간별로 일정수준 높아지면 카드사들은 그만큼 자금부담을 떠안게 된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넉넉하게 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산 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신용판매와 현금성 대출에 차등해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연체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등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이 신용판매와 현금성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신용카드 미사용 약정 즉 회원이 사용하지 않고 남긴 사용한도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은 남은 한도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도 높아지게 되면 각 카드사들이 지나치게 사용한도를 높여 카드를 발급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충당금 적립률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카드사에 부담이 지나칠 정도로 높일 생각은 없다"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을 감안해 카드사에 충당금을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계획에 시장전문가들은 각 카드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중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기업평가 강철구 수석연구원은 "각 카드사들은 타 금융권에 비해 충당금을 넉넉히 쌓아둔 편"이라며 "금감원이 현재 비율보다 크게 높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충당금을 많이 쌓는 것이 꼭 카드사에 긍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신규회원이 많이 늘어난 카드사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에 따른 충당금을 많이 쌓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금감원이 충당금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카드사들의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좋고 당기순익면에서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당장 충당금 비율이 높아지면 단기 부담이 불가피하고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일단 충당금 비율이 올라가면 당장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넉넉히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충당금 부담이 이어질 경우 우량회원들의 서비스 축소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