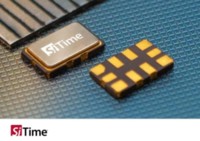한 도시의 문화 수준은 그곳이 어떤 예술가를 기억하고, 어떻게 예술을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거제는 산업과 해양의 도시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질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이 도시가 낳은 예술가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술가의 작품이 머물 공간을 갖추고 있는가. 양달석 미술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필자가 거제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양달석 화백의 작품을 보기 위해 몆 차례 전시 공간을 찾은 적이 있다. 마을회관 2층, 어렵게 마련된 작은 공간에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분명 깊이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감싸는 공간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한 생각이 스쳤다. '이제는 이분의 그림이 머물 제대로 된 미술관이 필요하구나.' 예술가의 격에 비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양달석은 거제가 낳은 대표적인 화가이자,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일상의 풍경과 인간의 내면을 묵직한 시선으로 화폭에 담아냈고, 화려함보다는 성찰과 사유의 미학을 선택한 작가였다.
그의 작품에는 전쟁과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 인간의 고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따뜻한 시선이 함께 담겨 있다.
양달석 화백은 이중섭 화백과 동시대를 살았고, 실제로 교류와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같은 시대의 아픔과 혼란을 통과하며 예술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이중섭이 소와 가족, 그리고 강렬한 선으로 인간의 비극과 사랑을 표현했다면, 양달석은 보다 절제된 색과 구도로 인간과 풍경을 관조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시대를 바라보는 예술가의 책임감과 진정성만큼은 서로 맞닿아 있었다. 오늘날 전국 곳곳에 이중섭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떠올릴 때, 양달석 미술관의 부재는 더욱 아쉽게 다가온다.
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저장소이며, 도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언어다. 양달석 미술관 건립은 한 예술가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거제가 어떤 도시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산업과 개발의 역사 위에 문화와 예술이라는 층위를 더하는 일, 그것이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국비 지원의 당위성 또한 분명하다. 양달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작가가 아니라, 한국 근현대 미술사 전체 속에서 평가받아야 할 예술가다. 그의 작품 세계와 시대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전시·교육할 수 있는 공간은 국가 문화자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미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등 주요 작가들의 미술관이 국비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례는 충분하다. 양달석 미술관 역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문화정책의 일부로 다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미술관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을 지닌다. 단발성 관광지가 아니라, 교육·연구·창작이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거제의 문화 지형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다. 지역 청소년에게는 예술적 영감을,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에게는 깊이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예술가는 떠나도 작품은 남는다. 그러나 작품이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양달석 화백의 그림은 이미 충분히 자기 몫을 해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그 이름과 작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양달석 미술관 건립은 과거를 기념하는 일이 아니라, 거제의 문화적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거제시는 그 책임에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