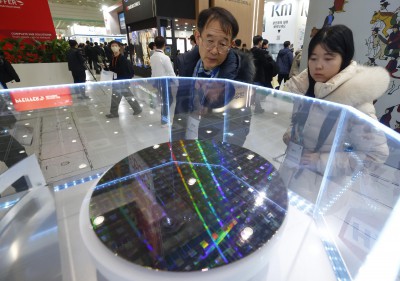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의 파고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핏줄인 소규모 사업장들이 생존의 기로에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인력난과 기술 격차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소규모사업장 훈련지원'은 가뭄의 단비와 같이 유효한 정책이다. 전문 교수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장에서 더 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좋은 제도'를 넘어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신청주의'를 넘어 '적극적 발굴 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당장 오늘의 생산량과 납기 맞추기에 벅찬 5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기술적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육을 기획해 폴리텍에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실 지원이 절실한 기업은 교육 정보를 찾을 시간조차 없는 '정보 소외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폴리텍이 '기술 주치의'가 돼야 한다. 대학이 지역 산업단지와 공단 곳곳을 누비며 기업들의 문을 먼저 두드려야 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의 공정 문제를 진단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면 생산성이 오른다. 우리가 이 기술을 훈련해 주겠다"고 먼저 처방을 내리는 '찾아가는 기술 컨설팅'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둘째, '일회성 교육'을 '지속가능한 솔루션'으로 고도화해야 한다.
며칠간의 방문 교육은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기업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 후 현장으로 돌아가면 직원들은 다시 익숙한 방식의 기존 업무로 회귀하기 쉽다.
이에 '교육+후속 멘토링'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담당 교수가 일정 기간 기업의 멘토가 돼서 배운 기술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스킬 전수를 넘어 스마트팩토리 도입, 공정 자동화 등 기업의 중장기적 기술 로드맵 설계를 돕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표준화된 맞춤'이 아닌 '모듈형·디지털 혼합'으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맞춤형 훈련'을 표방하지만 교수진의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모든 기업에 100% 다른 커리큘럼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되레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핵심 공통 기술은 온라인 '마이크로러닝' 콘텐츠로 개발해 사전 제공하고, 교수진의 방문 교육은 현장 장비를 활용한 '핵심 문제 해결(Problem-Solving)'과 '고급 실습'에 집중해야 한다. 즉, 디지털 교육(기초)과 방문 교육(심화)을 결합(Blended Learning)하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더 많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효율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업종별·직무별 우수 훈련 사례를 모듈화해 다른 소규모 사업장에도 빠르게 확산시켜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리이다. 이들의 기술 혁신 없이는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내 최고의 공공 직업교육 훈련기관으로서, 단순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규모 사업장의 '성장 파트너'이며 '기술 해결사'로 거듭나야 할 책무가 있다. 소규모 사업장 훈련지원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