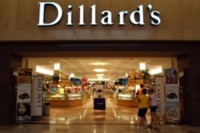TF, 12개 핵심 부처 집중 점검
文 정부 이어 적폐청산 '시즌2'
공직사회 번지는 불안감 고조
전임 정부 '정리' 악순환 지적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임 정부 인사 청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유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각각 설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각 부처별로 정부혁신 TF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총괄 TF 운영 기관인 총리실은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경찰·국무총리실·기재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KTV] |
여러 논란이 있지만, 관가에서는 이번 정부혁신 TF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1번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탄핵 이후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내걸기도 했다.
문 정부가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전방위 의혹을 조사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블랙리스트, 해외자원개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가장 큰 차이는 조사 방식이다. 문 정부는 부처 등이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적시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현 정부는 행정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인터뷰·서면조사·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업무용 PC와 문서를 열람하고,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 제출을 유도한다. 비협조 시에는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
내란행위 제보센터도 논란이다.'익명성을 보장한 제보'를 받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지만, '동료를 고발해야 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직사회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장관 등 부처 수뇌부 라인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일반 직원이 알 수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투서가 나오면 동료 간 신뢰가 완전히 깨진다는 것을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며 "TF 활동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조직 개편·인사 모두 올스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투서가 난무하는 경우 2017년 공직사회를 뒤흔든 대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적폐청산 과정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다만 특검,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박만 한다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