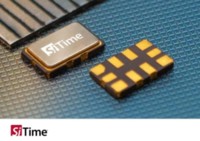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 첫애를 키울 때 밤새 자다 깨다 하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는 것. 지금 현주가 허리가 아픈 게 그때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몸이 안 좋아 낙태할 때 병원에 같이 가주지 않았다는 것. 낙태가 끝나고 마취에서 깨지도 못한 채 병실 밖에 나와 힘없이 앉아 있는데 그때서야 보러 왔다는 이야기 등등.....눈물이 줄줄 흘렀다.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예요. 그만 가세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했나요?"
“진석 씨는 인정도 없는 사람이예요. 그런 진석 씨를 그애는 그래도 사랑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자기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그 애는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요?”
“그렇게 몰라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돌아올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네에?”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이별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기차는 떠났고, 뒤에서 발을 굴러봐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발밑이 푹석 꺼지는 느낌 속에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전을 울렸다.
“그 애처럼 사분사분하고 강한 애가 그렇게 쉽게 넘어간 것도 이해가 가요. 여자는 그런 거예요”
아내가 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는 순간의 가벼운 느낌이 무너질듯한 통증 속에 일었다. 붙잡는다는 것이, 붙잡을 수도 없겠지만, 구속과 죄악인 것만 같은 참담함. 그리고 나자신이 교도소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비참함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우리 사이에 새로움이 없다면, 나는 못살 것 같아”
여린 미소를 띠며 스치듯 흘리던 아내의 말이 유언 같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패닉에서 매닉으로, 즉 경제적 공황에서 정신적 공황으로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 내 아픔과 공명하듯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게 들려오는 몰락과 파경의 소리들. 가정 파탄, 도산, 신용불량자, 우울증, 정신질환자 급증....진천 할아버지의 부음마저 들려왔다.
아차, 싶었다. 꼭 만나야 할 분이었다. 시간을 내서 며칠이라도 그분 곁에서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다고 벼른 지가 벌써 십수 년인데. 두꺼운 베일과 침묵에 쌓인 이야기. 그것의 대강을 알아버린 이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아리도록 비장한.....
아내가 집을 비운지 이틀째다. 아이들은 순간순간 감당 못할 떼를 쓰곤 했다. 밤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리던 경혜는 창가로 다가가더니 캄캄한 밖을 바라보면서 엄마, 엄마...하며 서러운 울음을 토해냈다. 아무리 달래고 안아줘도 막무가내로 창가로 달려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엄마만 불러댔다. 울다 지쳐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잠든 경혜....
소중한 분의 문상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경혜를 안아 이불 위에 주혜 곁에 눕히고도 잠이 안왔다. 자정이 넘었을까.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숙의 집에 있다고 했다. 숙은 남편의 학대를 못 견뎌 별거중인데 그녀의 집에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숙의 집도 진주에 있고 최영호의 집도 진주여서 아내의 말에 멀미가 났지만 캐묻지는 않았다. 캐묻거나 잡으면 더 비꾸러질 것만 같았다.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지만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아내의 목소리엔 끊을 수 없는 모정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집을 떠나 지독한 속도감으로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낯선 곳에 있으면서 전화로 아이들의 식사, 간식, 숙제들만큼은 챙겨주곤 하는 것이다. 며칠씩 들어오지 않으면서 말이다.